― 에두아르 르베, 『자살』, 워크룸프레스,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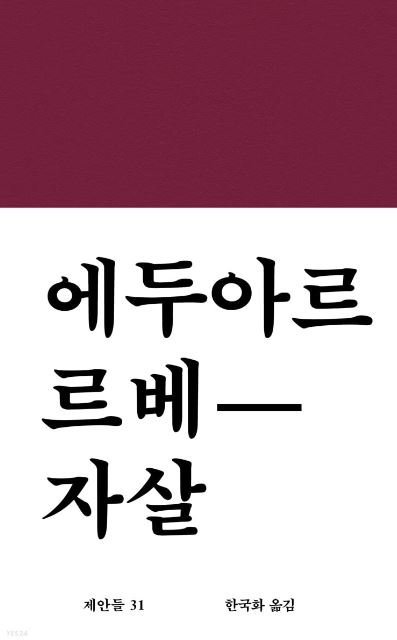
에두아르 르베는 『자살』의 원고를 출판사에 송고한 직후, 파리에서 자살했다. 그 때문인지 ‘자살’은 소설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소설을 완성한 형식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자살이라는 현실에서의 행위가 정확히 어떻게 소설이라는 ‘허구’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 짓는다는 것일까.
르베의 또 다른 소설 『자화상』이 온통 “나는”으로 시작되는 거대한 자기 묘사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자살』은 자살한 ‘너’에 대한 묘사로 가득하다. 이들 ‘나’와 ‘너’는 내용상 많은 것을 공유한다. 우리는 서로 겹치는 『자화상』의 ‘나’와 『자살』 속 ‘너’의 모습 때문에, 혹은 그를 향한 서술자 ‘나’의 시선이 지닌 집요함과 둘 사이의 숨 막힐 듯 가까운 거리 때문에, ‘너’와 ‘나’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는 양상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작가 르베의 진짜 자살은 ‘너’가 실은 ‘나’였다는 발견에 관여한다. 결론적으로 ‘나’의 이야기인 이 모든 소설에서 작가의 자살은 소설들이 쓰인 원인이자 그것을 완성하는 마침표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자살』은 작가의 극도로 나르시시즘적인 유서일 것이라고.
너는 다른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것처럼 사전을 읽곤 했다. […] 사전은 소설보다 세상과 닮았는데, 세상은 행위의 일관적인 연속이 아니라 지각된 것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물들이 서로 모이고, 지리적인 근접성이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사건들이 연속되면 우리는 그것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나는 너를 무작위로 기억한다. 주머니에서 구슬을 골라 꺼낼 때처럼, 내 머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부 사항을 통해 너를 되살려낸다. (41)
그러나 서사로서의 ‘자살’은 ‘나’와 ‘너’의 분리를 통해 유지된다. ‘나’가 서술하는 ‘너’의 삶-죽음은 너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 죽음을 그의 것으로” (35) 만든 아버지의 동일시와는 다르다. 작품 속에서 설정된 ‘나’와 ‘너’의 위치는 그 경계를 넘어서려는 ‘나’의 집요한 시도와 뒤따르는 실패를 만들어 낸다. 끝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너’를 ‘재구성된 꿈’으로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분리에 있는 것이다.
『자살』엔 기억 속에 (영원히) 산다는 것의 거의 모든 정의와 그것을 향한 욕망이 담겨 있다. 여기서 기억은 삶과 정반대의 속성을 갖는다. 삶이 비일관성과 미완, 거짓으로 점철된 무엇이라면 기억은 일관성과 완결을, 그러므로 영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건을 인과적으로 배치하고 거기서 완성된 의미를 발견한 것처럼 구는 것은 언제나 ‘삶’이다. ‘나’는 그 삶의 논리를 거슬러 ‘너’를 “무작위로” 기억한다. “삶의 죽음”이었던 ‘너’의 죽음은 네 “죽음의 삶을 구현”하며 『자살』 을 읽고 쓰는 ‘나’에 의해, “너의 자살에 살아남”는다(37).
여기서 서사적 완결성은 ‘너’를 끝없이, 무작위로 구성해 내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진실”(15) 이다. 서사는 근원적 원인을 상정하지 않고, 사건의 배열을 통해 인과성을 환유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때문에 꽤나 괜찮은 “자기발견적 heuristic 형식”*이 되기도 한다. 유서가 제 죽음이 읽히기를 원하는 전언이라면, 『자살』은 죽음과 동일시된 삶이 ‘나’의 자리에서 다시 쓰이기를 원하는 텍스트다. 작가 르베의 진짜 ‘자살’은 그런 『자살』의 유일한 저자이자, 심지어 유일한 독자가 되고자 했던 그의 절박한 기획이 되어 이 소설에 관여한다. 그러나 서사는 약속된 ‘나’는 물론, 약속되지 않은 또 다른 ‘나’들을 초대하기 마련이다. 네게 허락된 적 없는 낯선 우리가 제멋대로 “너를 되살려”(41)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처럼. 르베의 기획이 실패하는 이 왜곡의 순간이야말로 서사가 담보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다.
*캐롤라인 레빈, 『형식들』, 백준걸, 황수경 옮김, 앨피, 2021, 6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