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교수 서평칼럼

다루는 소재들도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서로 관련도 없다. 스모선수들이 승부조작을 하는 흔적이 있는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들이 어떻게 바뀌는 패턴은 어떠한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
사소하면 다행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총보다 수영장이 더 위험하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쓰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별로 영향이 없다든지 등등 정상적인 사람이면 불편해할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끼워 넣는다. 그래 놓고서는 책의 말미에서는 뻔뻔스럽게도 ‘하나로 통합된 중심주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스러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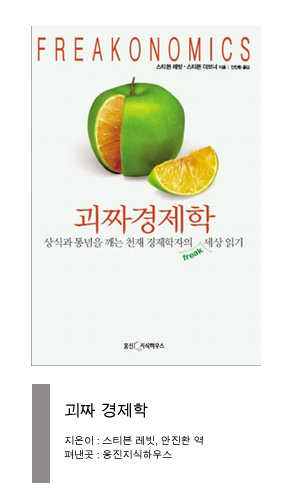
단 인센티브를 더 많은 금전적 보수로만 이해하는 누군가와 달리 저자들은 사회적 보상과 도덕적 보상도 중요한 인센티브로 여긴다. 이점에서 아담 스미스를 닮았다. 또 인센티브를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닌 자그마한 어떤 것”으로 여기며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집단의 행동을 따진다.
이점에서는 종의 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변이들을 연구한 찰스 다윈의 후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들 뿐이었다면 고전적인 관점을 잡다한 사례들로 풀어낸 읽을거리 수준을 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책이 좋은 진짜 이유는 통계를 통해 사회통념을 넘어서 더 나은 ‘사실’을 찾아가는 방식을 생생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풀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념이 맞는지 따져보기 위해 꼼꼼하게 어떤 데이터들을 비교해야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1990년대 미국의 범죄율 감소가 통념과 달리 강경한 치안정책보다는 경찰관수 증가와 더 상관관계가 높고, 또 경찰관수 증가보다는 1970년대 낙태허용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찾아낸다. 각각의 사례분석들도 이런 방식으로 방법을 달리하여 되풀이 한다. 여기엔 고등학교별 명문대 진학자수 집계 따위를 통계로 여기는 천박함은 따위는 발붙일 곳이 없다.
저자들은 통계수치에서 상관관계를 찾는 회귀분석이 학문이라기보다 “하나의 기술(art)”이라 언급하는데, 그들의 의심하고 비교하는 과정이야 말로 예술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과정들은 일찍이 J. S. 밀이 정리한 귀납의 방법들이기는 하다.
하지만 명작을 따라 그려보는 것이 좋은 그림을 그리는 감각을 익히는 지름길인 것처럼, 레빗이 이리저리 궁리하는 과정은 숨겨진 사실들을 찾아가는 감각을 익히기에 좋은 연습재료들이다. 다만 그렇게 찾아낸 ‘사실’들을 맹신하면 곤란하다. 레빗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주듯이 지표와 사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악서의 지표를 고루 갖춘 이 책이 악서가 아닌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