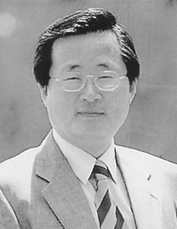
예상치도 못했다. 처참한 몰골로 물줄기도 말라붙은 봇도랑에 처박혀 있던 나무 뿌리의 속살이 이렇듯 황홀한 동녘의 붉은빛을 머금고 있을 줄은. 뿐인가. 이웃들의 한가한 오전을 방해하며 이끼가 앉은 껍질을 그라인더로 털어 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비틀린 나무 뿌리에서 그토록 맑고 깊은 향기가 뿜어 나올 줄은 정녕 몰랐다. 지난 토요일, 재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도 끝났는지 빈집도 많아 폐허처럼 변한 광명시의 야산을 거닐다 꽃받침대로 만들까 해서 들고 온 향나무 뿌리는 이처럼 나를 두 번이나 놀라게 했다.
톱밥으로 누렇게 덮인 좁은 마당 한 구석에 물러나 앉아 반쯤 벗겨진 향나무 뿌리의 화사하다 못해 요염하기까지 한 속살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어쩌면 이런 놀라운 변모를 확인하는 기쁨 때문에 이제는 그만 집안에 구질구질한 물건들을 들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도 짐짓 못들은 척하는지도 모른다. 지난 2월 상원사를 거쳐 건봉사를 다녀오면서 무쇠솥을 가져올 때도 그랬다.
오랜만에 쏘이는 바닷바람에 취해 평소의 주량을 넘긴 탓에 무거워진 머리를 식히려고 같이 간 동네 아저씨와 속초의 뒷동네를 돌아보다 고물상 한쪽에 수북히 쌓여 있는 무쇠솥 더미를 발견했고, 그중 튼실한 놈을 만 원도 안 되는 값으로 사 가지고 여관에 들어서자 아내는 일행을 돌아다보며 아무도 못 말린다는 듯 웃기만 했다.
그러나 아내의 이런 난감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녹을 털어 냈고, 무쇠솥은 화답이라도 하듯 비바람에 녹슬었던 속살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마 붉은 녹을 털어 내고 동백기름을 칠해 주었을 때 그가 보여준 의젓함과 너그러움이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우리라. 그래서일까. 요즘은 호미며 톱, 전지 가위는 물론 아침마다 찾아와 짹짹거리는 참새들에게 주려고 사 온 좁쌀 봉지 등을 넣어 마당 한 쪽에 밀어 놓은 무쇠솥을 나보다 아내가 더 요긴하게 쓰는 눈치다.
지난 화요일 많은 관심 속에서 거행된 108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했을 때, 나는 마당의 무쇠솥과 초석만 남은 가람터가 많아 허전했지만 그래서 더 장엄했던 건봉사의 경내, 그리고 아직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향나무 뿌리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철밥통의 관행을 깨뜨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일까. 자리보전에 급급해서 어느새 학문적 열정과 패기도 다 잃어 버리고 녹슬기 시작한 무쇠솥 아니, 차갑게 식은 철밥통으로 변한 자신에 대한 자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직은 많은 사찰에서 보여주는 졸속에 가까운 복원과 증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중후하고 웅장했던 건봉사의 모습에 100년 동국의 미래를 겹쳐 보았기 때문일까. 108번뇌를 짊어진 무쇠솥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둠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이 서 있는 동악로를 걸어 내려 올 때 건봉사 사적을 편찬했던 만해의 시가 떠올랐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